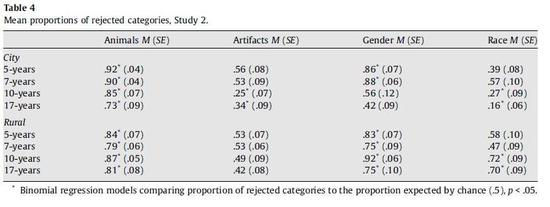|
|||||||||||
글: 인지심리 매니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위 문구는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 일부분이다. 고등학교 시절 이 문장을 처음 접하고 의아해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왜 하필 문화 강국인가? 군사 강국도 있고 경제 강국도 있는데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문화’로 어떻게 강국이 되는 걸까?
이 책은 문화의 역할을 진화적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또, 역사적 사례나 인구학적 천이 등 실제 현상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주장한 가설들이 실험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다면 더 없이 훌륭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견해
이 책은 진화심리학이 아닌 또 다른 시각으로 진화 과정을 조망한다. 심리학은 문화가 인간 심리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저자들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인간은 문화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심리에 맞는 문화를 받아들인다. 저자들은 이를 ‘편향된 전달’이라고 부른다. 편향된 전달에는 순응 편향, 빈도 편향, 모델 편향이 있다. 각 편향들은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심리현상과 같은 맥락선 상에 있다. 하지만 문화는 편향의 힘을 압도해서 전달될 수 있다. 문화는 유전자 또는 인간 심리의 줄에 묶인 개가 아닐 수도 있다.
문화는 심리적 현상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심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문화가 인간의 인지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2011/07/31 - [인지심리기사/지각] - 종교가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들을 볼 때마다, 어쩌면 문화가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필자처럼 어리석은 심리학도의 짧은 식견과 달리, 세상은 인간 심리만으로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문화와 유전자, 심리의 공진화로 설명 가능한 복잡한 체계일지 모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인간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기타심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ED] 수잔 케인 - 내성적인 사람들의 힘 (0) | 2012.07.27 |
|---|---|
| 광고의 효과는 보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0) | 2012.07.15 |
| 부자는 종교를 이용해서 불평등을 통제한다 (3) | 2011.08.13 |
| 독일 교회 사회는 카톨릭 사회보다 신뢰롭다 (0) | 2011.08.03 |
| 신에 대한 관점과 부정행위 (0) | 201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