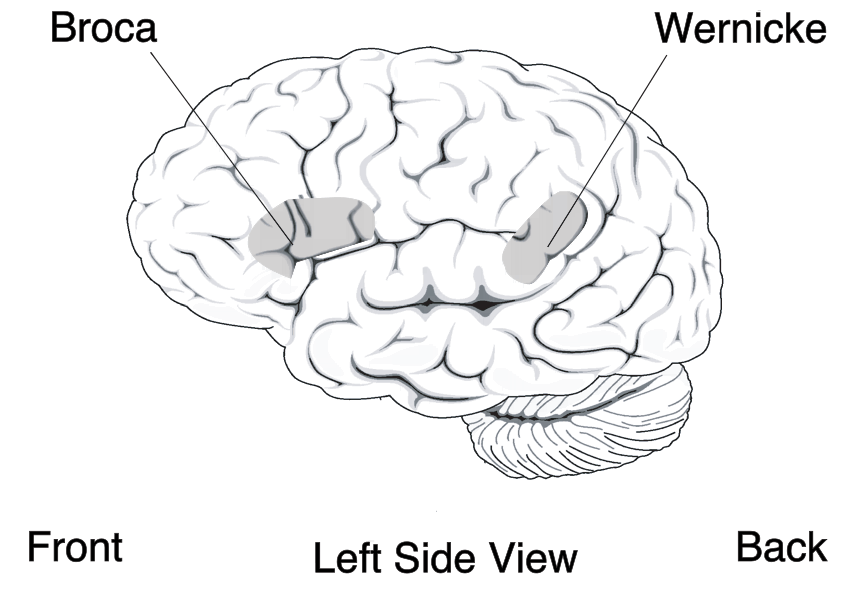출처: Music Matters(Henkjan Honing)
번역: 인지심리 매니아
아기를 갖게 된 부모들은 아기와 대화할 때 이상한 언어를 구사한다. 아빠와 엄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아기와 이야기 할 때 "두 두 두 두, 다 다 다 다"같은 일종의 옹알이를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기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걸까? 이 "두 두 두 두, 다 다 다 다"는 무슨 뜻일까?
어른이 아기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이 옹알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infant-directed speech(IDS)라고 한다. IDS는 정상적인 성인의 언어와 구분되며 높은 음, 과장된 멜로디의 높낮이, 느린 템포, 변화무쌍한 리듬을 특징으로 한다. IDS는 일종의 음악적 언어지만, 의미가 불명료하고 문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babble music'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기들은 babble music을 좋아하며, 부모가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 마치 폴리스의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데 두 두 두, 데 다 다 다"나 카일리 미노그의 "라 라 라"가 매력있는 것과 같다.
부모가 아이와 하는 babble conversation은 전세계적으로 기록되어 왔다. 이 중 몇 개를 들어본다면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는지는 음높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대화가 놀이에 가깝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설득하는 목적으로 쓰일 때 더욱 명료해진다. "That's the way!"같은 격려의 문장이나 "잘했어" 같은 문장은 보통 음높이가 상승하다가 내려가는 양상을 띠면서 가장 높은 음을 강조한다. "아니, 그만" 같은 경고나 "조심해, 만지지 마!"같은 문장은 낮은 음높이와 함께 스타카토 같은 리듬을 가진다. 만약 이 대화를 필터링해서 음소를 제거하고 오직 음악적 부분만 남겨놓는다 해도, 우리는 이 소리가 격려 또는 경고의 메세지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의미 정보가 언어 자체가 있기 보다 멜로디나 리듬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리듬이나 강약, 억양이 유아로 하여금 자기 문화의 언어에 익숙해지게끔 만든다고 본다. 단어와 단어의 분절은 과장된 억양의 높낮이와 리듬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특정 단어 학습이 촉진된다.
교육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이렇게 "babble music"을 사용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 유아들은 태어난지 아홉 달이 지나서야 성인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지만, babble music의 경우 태어난 직후부터 관심을 보인다. 특정 단어나 단어의 분절, 소리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생후 일년이 지나야 형성되며, 이때부터 의미있는 단어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 IDS가 언어 학습의 보조도구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안적 설명은 IDS가 언어적 준비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언어적 형태라고 주장한다. 진짜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동안 의사소통을 위해 일종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언어는 감정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언어는 문법은 없지만 여전히 정서적 의미를 지닌 언어다.